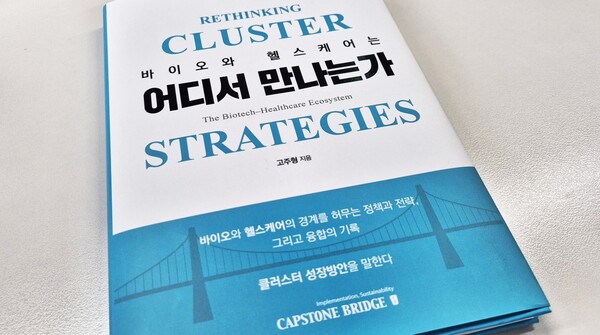
[라포르시안] 캡스톤브릿지 고주형 대표가 바이오와 헬스케어 산업의 접점을 탐구한 신간 ‘바이오와 헬스케어는 어디서 만나는가’를 출간했다.
이 책은 바이오와 헬스케어를 단순히 기술 산업의 관점에서 분리해 바라보는 기존 시각에서 벗어나, 정책·법률·제도·인력·지역이라는 다양한 요소가 맞물린 융합 생태계로 조망하는 시도를 담았다.
저자는 지난 20여 년 동안 경영 컨설턴트, 정책 자문가, 현장 연구자로 활동하며 마주한 경험을 토대로, 기술보다 제도, 사람보다 구조의 문제가 더 본질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공공의료가 환자 곁을 지키는 동안, 바이오 산업도 공공의 손을 통해 성장해 온 만큼, 바이오와 헬스케어가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구조 안에서 함께 설계돼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책은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돼, 바이오와 헬스케어 생태계의 현실과 과제를 구체적으로 짚는다. 1장 ‘클러스터, 과연 생태계 구축은 가능한가’에서는 전국에 수많은 클러스터가 조성됐지만 실제로 산업화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다는 현실을 지적한다. 단순히 입지를 지정하거나 집적지를 만들었다고 해서 곧바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클러스터를 공간적 집합이 아니라 전략적 설계와 구조적 연결로 다시 바라봐야 한다고 제안한다. 유치와 설계, 성과와 시간의 논리를 통해 클러스터가 생태계로 작동하기 위한 조건을 되묻는다.
2장 ‘병원은 경계를 넘을 수 있는가’에서는 병원이 단순한 진료 공간을 넘어서는 변화를 집중 조명한다. 저자에 따르면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역할과 동시에 실증 현장이자 지역 산업 거점, 나아가 국가 재난과 위기 대응의 전략 인프라로까지 기능이 확장되고 있다. 저자는 병원이 기술과 환자, 진료와 산업,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의 경계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지, 내부 조직은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지를 고찰한다.
3장 ‘대학이 빠진 클러스터는 뿌리가 없는 것이다’에서는 대학의 전략적 역할을 강조한다. 바이오·헬스케어 분야는 고위험·고불확실성 구조 속에서 신뢰와 연결을 설계할 수 있는 주체가 드물고,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플랫폼이 바로 대학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단순한 산학협력을 넘어, 인재 양성, 실증 연계, 정책 파트너십까지 아우르는 대학의 기능을 분석하며, 대학이 공공성과 전문성을 결합한 중심 축으로서 클러스터 설계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4장 ‘작동의 조건, 정책과 시장 사이’에서는 기술 실증 이후 나타나는 병목 현상을 다룬다. 규제, 자금, 제도, 수용 구조가 따로 움직이면서 정책은 실행력을 잃고, 기술은 시장 진입 문턱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저자의 지적이다. 저자는 창업 생태계의 어려움, 글로벌 진입 장벽, 의료데이터 활용 제약 등의 사례를 들어, 기술 발전 자체보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마지막 5장 ‘지역이 이끄는 클러스터 재설계’에서는 왜 어떤 지역은 글로벌 기업이 몰려드는 반면, 어떤 곳은 막대한 투자가 들어가도 공허한 단지만 남는지를 분석한다. 여전히 지자체 단위로 비슷한 시설을 반복적으로 조성하는 현실을 비판하며,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조건은 단순한 예산이나 시설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실제 작동하는 클러스터의 원리를 짚고, 우리 지역이 직면한 구조적 한계와 가능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저자는 “이 책은 완성된 해답을 제시하기보다 우리가 어떤 구조를 만들고 있는지, 서로 다른 언어들이 어디서 만나야 하는지를 묻는 기록”이라며 “바이오와 헬스케어 생태계의 균형과 깊이를 확보하기 위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